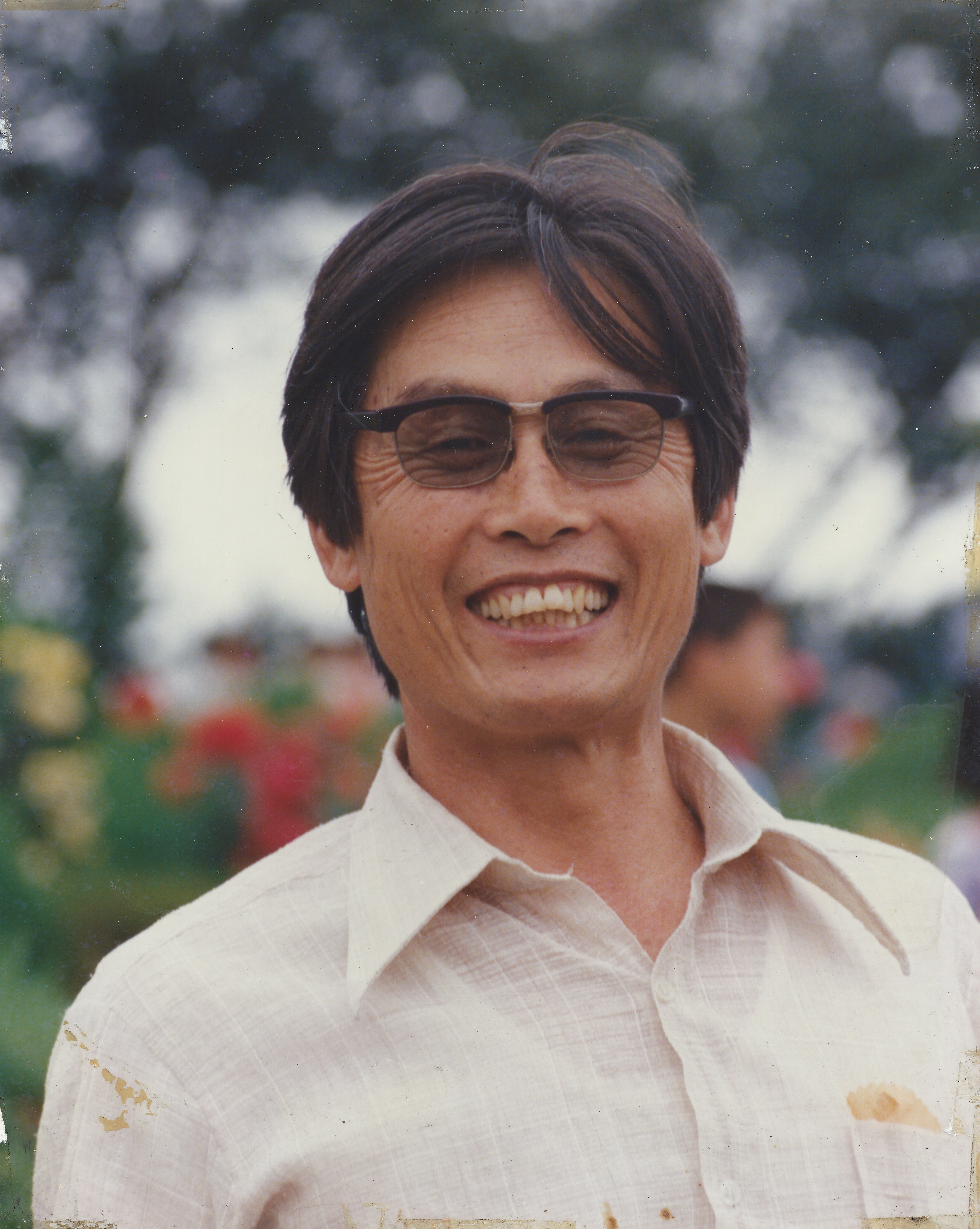반응형
월간조선 2007년 11월호
1951년「조선의 학살」발표되자 空超 등 문화인 30여 명과 피카소 비판 성명
金炯國 前 서울大 교수 - 1942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大 사회학과 졸업. 美 캘리포니아大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大 환경대학원 교수, 同 환경대학원장, 조선일보 비상임논설위원,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 한국미래학회장 역임.
화가 김병기
피카소와의 만남
현대에 들어 이루어진 한국과 스페인의 만남은 희대의 천재 예술가 피카소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루어졌다.
비록 식민치하의 한반도이었지만 근대화의 물결을 좇아 20세기 초부터 선각 예술지망생들이 일본으로 그림 유학에 나섰다. 거기서 그들이 소문만 듣고 흠뻑 동경해 마지않던 세계적 화가 가운데는 피카소가 들어 있었다. 피카소가 20세기 전반의 한국 지식인들에게 투우와 카르멘의 나라로 소문난 스페인의 예술적 정점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우리만 피카소의 高名(고명)을 알았던 것이 아니다. 「위대한」 피카소는 1939년 6월15일 밤, 파리 무용계에 혜성처럼 데뷔한 「코리언 댄서」 崔勝喜(최승희)의 공연 관람을 통해 조선의 예술을 만나고 있었다(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세계를 휘어잡은 조선여자」, 뿌리깊은나무, 1995).
1930년대 초 일본으로 그림 유학을 갔던 金秉騏(김병기·1916~ )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東京(동경)미술학교를 세 번째로 졸업한 선각 양화가 김찬영의 아들이다. 그는 특히 피카소 예술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깊었다.
김병기 같은 일본 유학 미술학도들에게 피카소는 현대미술의 이정표로 여겨졌다. 제작하는 작품마다 번뜩이는 천재적 조형성에 더해, 사회의식이 돋보인 덕분에 피카소는 세계 識者(식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스페인 內戰(내전) 당시 프랑코 장군을 지원했던 나치 독일공군의 민간인 폭격을 고발한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1937)에는 현실에 대한 피카소의 올곧은 사회의식이 담겨 있다.
자유를 찾아온 金秉騏와 李仲燮
피카소가 보여 준 사회의식은 결코 一回性(일회성)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그들이 공급한 석탄을 때지 않은 채 冷房(냉방)에서 작업했다든지, 곡예사를 즐겨 그릴 정도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에게 눈길을 주던 연민이 그의 브랜드였다. 피카소는 그렇게 세계 예술계에서 신화가 되어 있었다.
일본 유학을 마친 김병기는 광복의 기쁨을 고향 평양에서 맞는다. 거기서 그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서기장 일을 맡았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나랏일을 해야지, 靜物(정물)은 왜 그려?』라고 질책하는 북한 공산정권의 실체를 몸으로 깨닫자 표현의 자유를 찾아 곧장 越南(월남)해 버린다(김형국, 「작품 속 공간을 찾아서: 서양화가 김병기」, 문화예술, 2005년 11월호).
6·25 전쟁이 터지자 김병기는 從軍(종군)화가단에 들어가 부단장 직책을 맡았다. 『소를 탄 童子(동자)는 왜 그렇게 여윈가?』란 질책을 받고 월남한 李仲燮(이중섭)도 종군화가단에 들어왔다.
천재였으나 불운했던 점이 모딜리아니를 닮았던 이중섭과 김병기의 인연은 각별했다. 동갑인 두 사람은 同鄕(동향)인데다 평양에서 소학교를 다닐 때 한 반이었고, 일본 도쿄의 문화학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생이었다.
김병기는 日帝(일제)시대의 많은 識者(식자)들이 그랬듯이, 한때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다. 러시아 문학을 탐독하는 문학청년이던 그는, 1937년 막심 고리키의 장례식에 초대받아 추도사를 했던 프랑스 문학가 앙드레 지드가 소비에트 러시아의 주선으로 학교와 공장을 둘러본 뒤 쓴 「소비에트 기행」을 읽고 난 후, 공산주의로부터 멀어졌다. 「소비에트 기행」은 자유진영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중요 단초가 되었다.
광복 직후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목격하고, 이를 참지 못해 월남했다가 다시 북한의 南侵(남침)을 겪게 된 김병기는 말 그대로 「의식 있는」 反共(반공)으로 돌아섰다.
피카소가 美軍(미군)의 북한주민 학살을 개탄하며 「조선의 학살」(1951)을 그렸다는 「참담한」 소식을 부산 임시수도에서 外誌(외지)의 조각 기사에서 읽은 김병기는 反共의식이 폭발했다.
「조선의 학살」 제작 이전에는 피카소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김병기를 포함한 한국 지식사회는 별달리 반응하지 않았다. 「나치 치하의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가 가장 치열하게 레지스탕스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피카소가 공산주의자가 된 계기였다」는 내력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고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였고, 언젠가 궁극에 가면 참 예술가가 이념의 포로가 될 리 만무하다고 믿고 있었다.
피카소 作「조선의 학살」.
피카소와의 결별
그렇게 수긍하던 피카소인데 뜻밖에 「조선의 학살」은 김병기의 생생한 개인적 체험에 비춘다면 잘못된 판단의 소산일 뿐이었다. 무엇보다 미군의 양민 학살을 상징한 「조선의 학살」은 그가 직접 목격한 학살과 너무 달랐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나중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 책임을 오히려 참전 미군에게 전가하는 뻔뻔스러움을 견딜 수 없었다.
실망한 나머지 그는 피카소에게 항의 편지를 썼지만 전쟁 중이라 편지는 부치지 못했다. 대신, 시인 空超 吳相淳(공초 오상순) 등 30여 명의 문화인들이 모인 부산 남포동의 으슥한 다방에서 「피카소와의 결별」이란 선언문을 낭독하는, 요즘 말로 퍼포먼스를 펼쳤다. 남침으로 동족 싸움을 시작한 북한 공산주의자를 그림으로 옹호하는 피카소를 참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글은 뒤에 월간지 「문학예술」(1954)에 실렸다. 『황해도 신천이 그림의 현장』이라며 북한이 만들어 놓은 기념관을 한참 나중에 직접 찾았던 그림 애호가 金源一(김원일) 소설가는, 김병기의 지적대로 『학살을 말해 줄 증거를 북한이 내놓지 못했다』고 그의 단행본 「피카소」(이룸, 2004, 466~471쪽)에 적었다.
「조선의 학살」은 북한의 남침을 당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우리 미술 교과서에서 피카소가 20세기 최대의 천재 화가라는 사실은 적시해도, 「조선의 학살」에 대한 언급은 예외였다.
反共을 國是(국시)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조선의 학살」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利敵(이적) 출판물」의 한 유형으로 여겨져 언론 매체나 화집에 도판으로 소개되지 못했다.
「조선의 학살」 때문에 피카소 이름의 方外(방외) 사용마저 한때는 금기였다. 「피카소 크레파스」, 「피카소 수채화」 등의 이름으로 물감을 만들어 온 회사 대표를 反共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회사제품의 광고를 중지시킬 정도였다(중앙일보, 1969년 6월9일).
국립현대미술관, 2004년 「조선의 학살」 국내 전시 추진
한편, 피카소에 대한 항의 퍼포먼스로 김병기는 斯界(사계)의 주목을 받는다. 「예술론을 대학 강단에서 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다. 그 길로 피란 중이던 서울大의 미술대학 교수가 되었다. 미술사를 공부한 적 없었지만 문학청년으로서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는 아무도 미술비평을 쓰지 않던 그 시절, 미술 관련 글을 신문과 잡지에 즐겨 썼다.
1950년대 후반 그는 대학에서 서울藝高로 자리를 옮겨 미술 조기교육에 앞장섰다. 1960년대 중반 이후는 주로 미국에서, 간간이 한국에서 열심히 추상화를 그리는 우리나라 最長壽(최장수) 현역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림 제작이 이념성에서 출발했지만, 위대한 작품은 이념을 초월한 보편성으로 그 진가가 빛났다. 이념은 현실 왜곡의 포로가 되기 쉽지만, 좋은 예술은 현실의 많은 굴곡을 이겨낸 인간승리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학살」이 피카소의 독보적 예술성에 빛나는 기념비적 작품의 하나인지 아닌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던 이념은 실체적 진실 면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완패했다. 한때 피카소가 옹호했던 공산주의가 1세기의 수명도 누리지 못하고 舊(구)소련의 와해로 붕괴되었고, 공산주의 낙원을 만든다던 북한이 역사적 변환에 뒤처진 채 지독한 독제체제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할 뿐이다.
2005년 9월 제주도 서귀포「이중섭기념관」개관식 참석차 귀국한 김병기 화백(오른쪽 끝).
피카소의 북한정권 옹호는 오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미술계에서 左派(좌파)들이 勢(세)를 얻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2004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쟁과 평화展(전)」에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이 소장 중인 「조선의 학살」을 전시할 계획이었지만, 不發(불발)되었다. 촉박하게 임대를 요청하는 기술적 미숙이 있었지만(조선일보, 2004년 6월23일), 한반도 상황이 평화 정착과 아직 거리가 먼데다, 세계적인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이 문제의 그림을 정치선전 도구로 삼아 온 점이 불발의 원인인 듯싶다.
피카소가 이룩한 높은 예술세계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을 오늘의 스페인 藝壇(예단)이 대한민국이 불과 한 세대 만에 「근대화의 꽃」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세계사적 성취를 평가하는 사이에, 피카소의 북한 공산주의 옹호는 한때의 시대적 착오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반응형
'2. Humanities > 22_한국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갑식의 奇人異士] 이몽룡과 관방제림, 춘향과 광한루 (0) | 2015.11.17 |
|---|---|
| 336만여자 고려사 필사본 英서 발견 (0) | 2015.11.15 |
| 스스로 고백했듯 ‘좌익의 아들’이요, ‘성공한 재미교포 사업가’였고, ‘전경환의 오른팔’을 거쳐 ‘DJ의 충신’이 됐던 박지원! (0) | 2015.10.26 |
| 조선 근대 사진 역사 (0) | 2015.10.23 |
| 임오군란에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당시에 인후염에 말라리아까지 걸렸다 (0)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