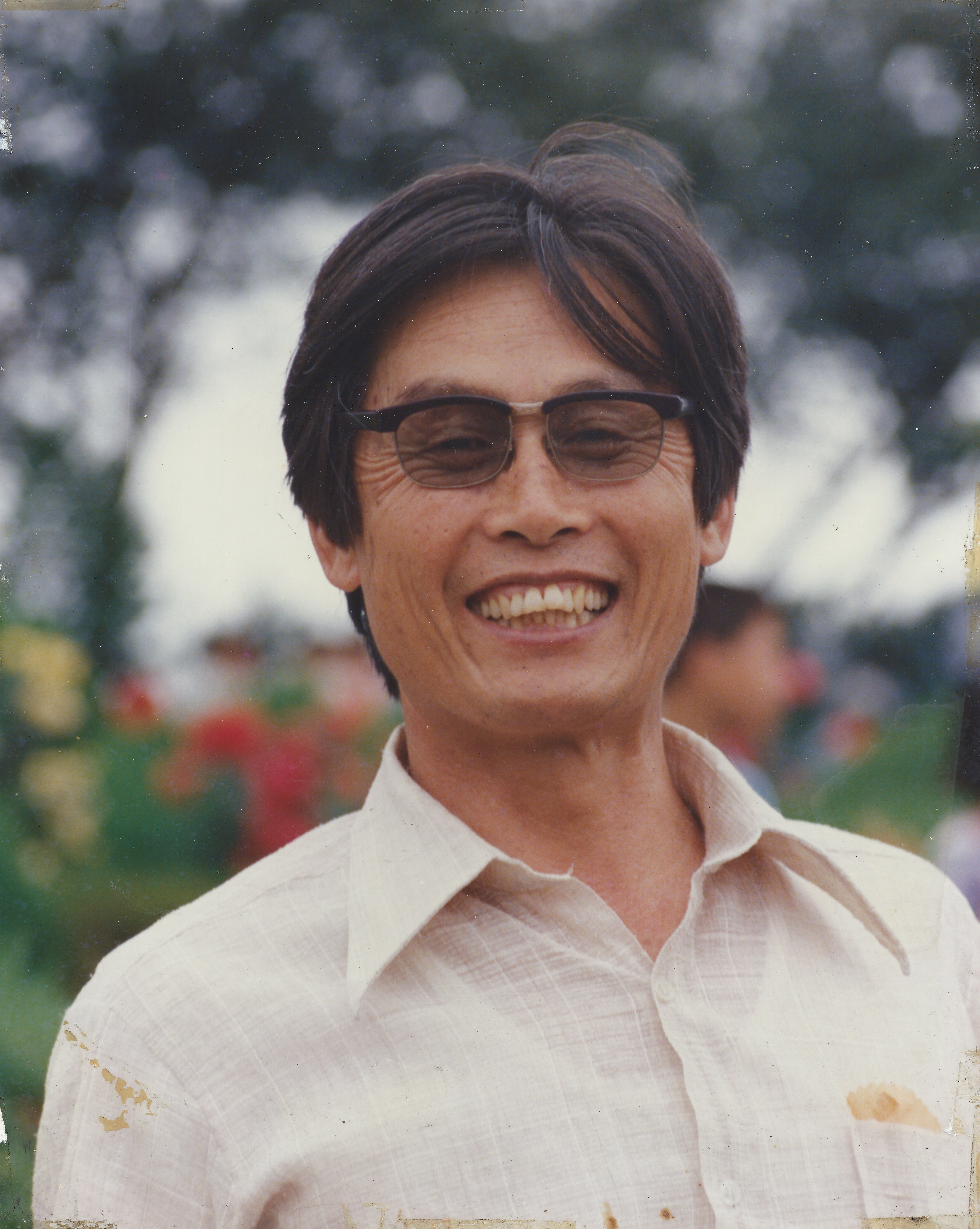6.25전쟁 중의 중국 공산군
중국 인민지원군의 시각으로 기록한 한국전쟁 사진집이 나왔다.'영광스런 중국 인민지원군'(중국 해방군화보사, 1959년)의 사진과 사진설명을 따서 펴낸 '그들이 본 한국전쟁 1'(눈빛출판사)이 그것. 원저는 중국 인민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한 뒤 그들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홍보를 위한 시각이 다분하지만 압록강 도하, 그들에게 잡힌 미군포로, 인해전술때 불어제낀 날라리, 폭격을 피하기 위한 물밑다리 등 우리 쪽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전쟁의 나머지 반쪽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전쟁 끝 무렵 후방에서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에 뛰어들어 활동한 사실은 이채롭다.(한겨레, 2005.6.22)

함께 일하는 옛 전쟁터에서 다시 봄날이 왔다.

짚차를 타고 도주하던 미군 병사들(차 양쪽의 손을 든 사람들)을 사로잡은 중공군 병사들.

전투가 없는 날 중공군 병사들이 민가 아낙네의 봄 밭갈이 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북한 위문단이 지원군 시공부대에 와서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전쟁이 끝난 뒤 재건사업에 투입된 중국군 병사들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 포탄 구덩이들을 메우고 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

북한 주민들이 포화를 무릅쓰고 지원군을 위해 밥과 물을 나르고 있다.

1951년초 눈 덮힌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진군 나팔소리에 맞춰 돌진하는 중국군 병사들.

김일성이 직접 중공군 1차 귀국 부대를 송별하고 있다.

한 노인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갓을 지원군에게 작별 선물로 주고 있다.

1951년초 서울에 입성한 중공군과 북한군 병사들이 중앙청 앞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압록강변의 국경도시 신의주에서 열차로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중공군 귀국장병들을 환송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의 한 노인이 지원군에게 길 안내를 하고 있다.

군대와 함께 출정한 중국 민간인 수송대의 우마차 행렬이 눈밭 속에서 전쟁물자를 실어나르고 있다.

입공희보 1951.8.31.중국조선철로군사관리국에서 요서성철도현형국동에게
항미원조공로로 준표창증서

중국 인민지원군은 한국군 4개 사단, 5만여 명을 섬멸하였다. 포로들이 후방으로 이송되고 있다.






중국 인민지원군은 전쟁이 끝난 뒤 북한의 전후 복구사업도 도왔다. 폐허 위에 새집을 짓는 모습이다.

▲6·25 전쟁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공군 병사들.
[2010, 인물로 다시 보는 6·25] 중공軍, 휴전후에도 北 잔류…"점령군처럼 행동" 비판받아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상에서 남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과 함께 공산군 대표로 참여했다. 1950년 10월 이후 유엔군과 실제로 싸운 교전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또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에도 중공군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중국은 6·25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상황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모택동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중공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대부분 북한에 잔류시켰다.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견제하고 북한의 경제 복구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담겼다.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을 펴낸 선즈화(沈志華) 중국화동사범대 교수에 따르면 1954년 9월 7개 사단, 1955년 3월 6개사단이 철수했지만, 1956년 4월까지 북한에는 여전히 44만여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북한에 남은 중공군은 북한 권력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중공군이 '점령군'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선즈화 교수는 "중공군 간부들이 조선(북한)의 법률과 풍습을 위반하고, 조선의 시민에 대해 거만하게 대하면서 조선의 개별적인 사건들에 내정간섭을 한 것에 대해 조선의 공민들과 심지어 지도자들도 점령군으로 인식한다"는 1957년 중국 주재 소련대사관 문서를 제시했다.
김일성은 1955년 말부터 중국을 등에 업은 연안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을 통해 김일성에게 반격을 시도한 반(反)김일성 세력의 뒤에는 소련과 중국이 있었다. 김일성은 국내적으로 반(反)종파 투쟁을 벌여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후, 1957년에도 계속 갈등을 빚던 중·소 분쟁에서 모택동의 손을 들어줬다. 모택동은 김일성의 반(反)종파 투쟁에 연루된 친중(親中) 인사들을 중국으로 도피시켰고, 1958년 북한에 남아있던 중공군 25만명을 모두 철수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