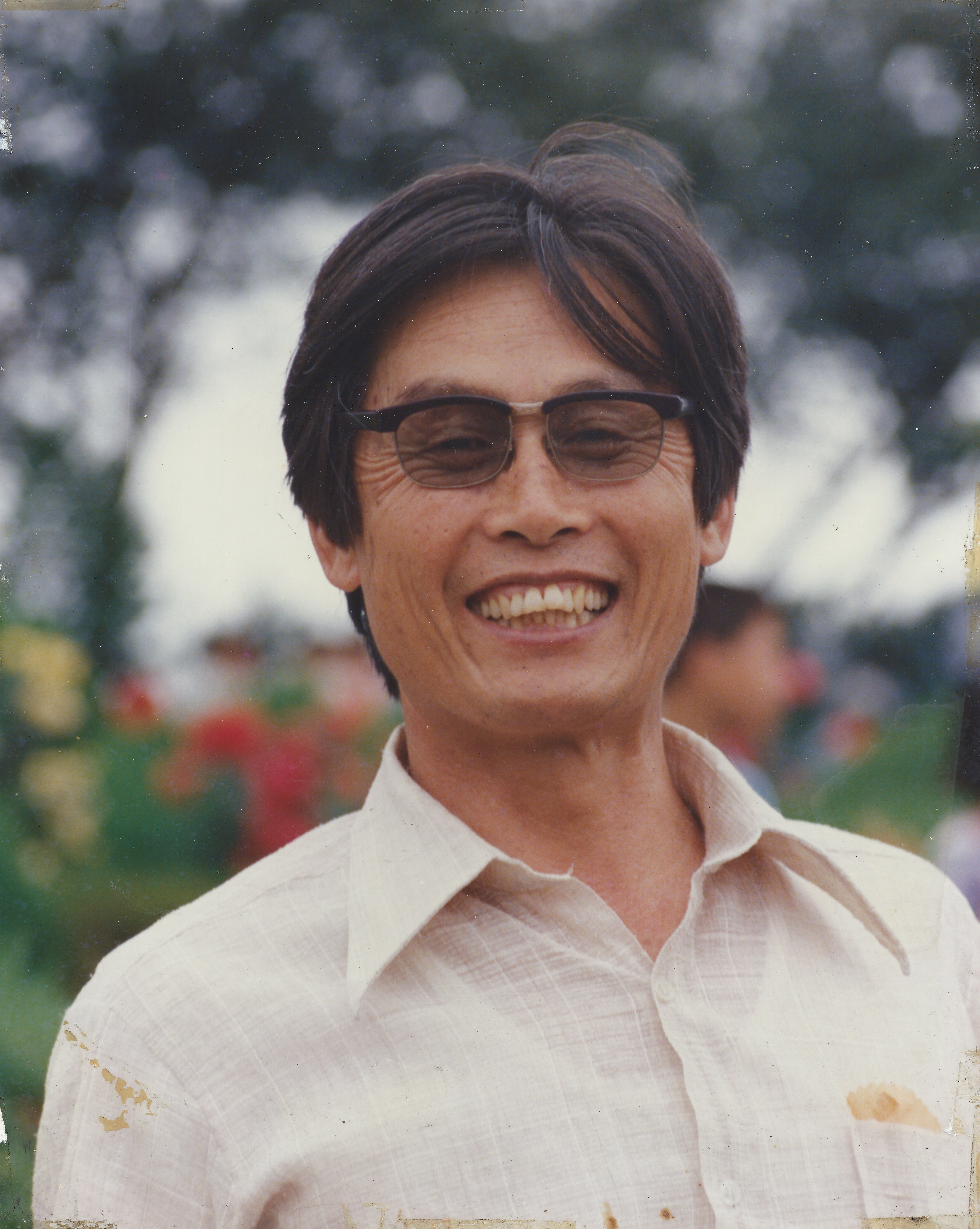반응형
반응형
'4. ETIC > 41_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전철 안에서 우연히 주은 시 (0) | 2008.10.18 |
|---|---|
| [스크랩] Loving you -Kenny G (0) | 2008.10.13 |
| 병(病)수발의 사회학 2008/10/02 15:17 (0) | 2008.10.05 |
| [스크랩] Let Me Be There / Olivia Newton John (0) | 2008.07.05 |
| [스크랩] 한국을 조진 100인의 개새끼들 (0) | 2008.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