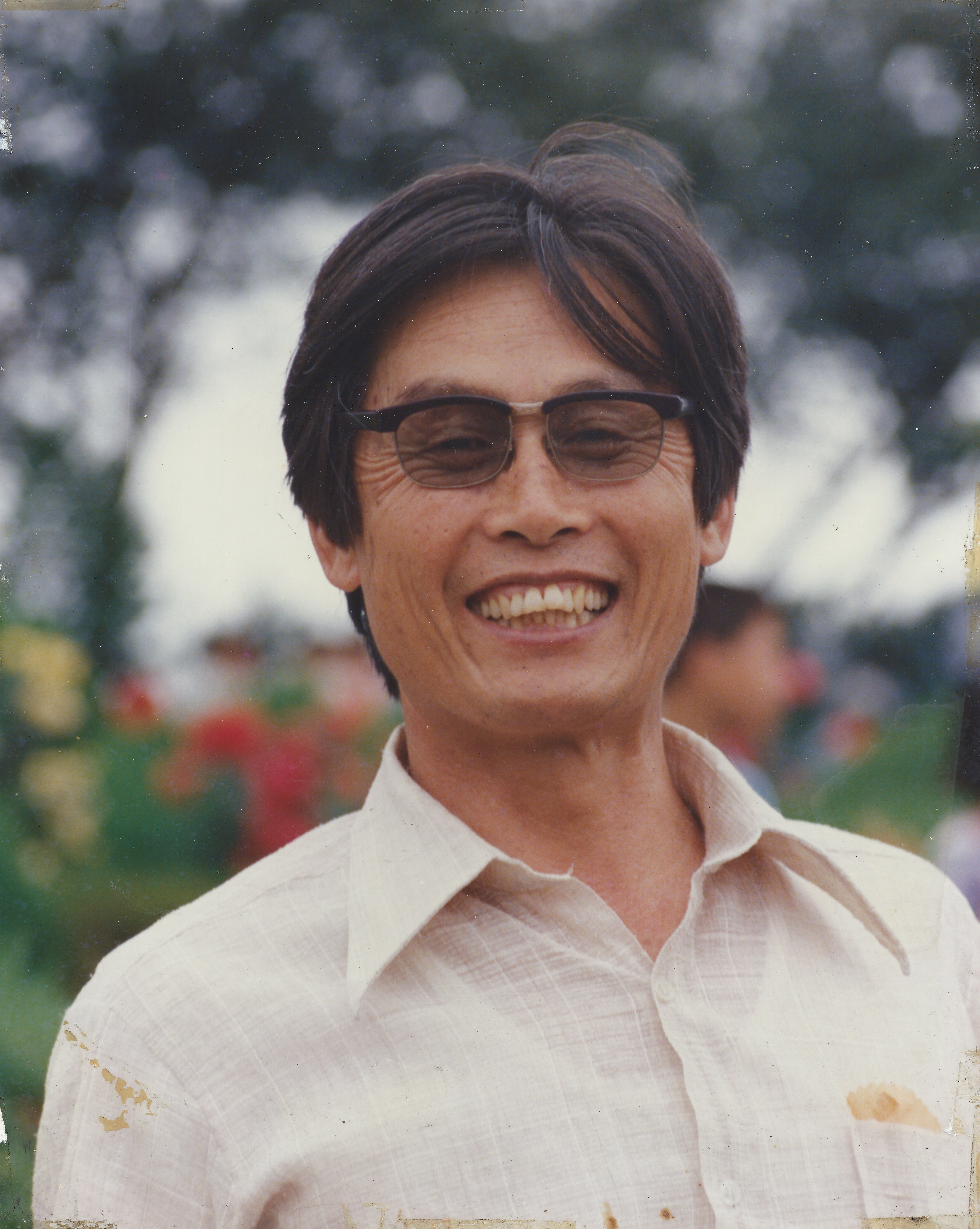질책 쏟아졌던 허수경씨 모녀(母女)기사
재능 넘치는 방송인 허수경(42)씨를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한 것은 출산이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는 정자은행 도움을 받아 2007년 말 인공수정으로 딸을 낳았다. 두번의 결혼과 두번의 이혼. 더 이상의 결혼은 원치 않았다. 하지만 아이만은 꼭 갖고 싶었다. 그는 결국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았고,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 후 1년7개월. 허씨 모녀의 근황을 전한 며칠 전 본지 기사엔 많은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 어떤 분은 전화를 걸어와 '비정상적 가족'을 미화했다며 분노했고, 40년 독자라는 분은 이메일로 취재팀의 '몰상식'을 따졌다. 인터넷 댓글도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생각 이상의 역풍(逆風)에 취재팀도 놀랐다.
비판의 요지는 허씨가 자신의 행복만 생각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딸의 장래를 생각해보았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아이는 애완용이 아니다"는 질타도 있었다. "가정해체"를 개탄하거나 "대자연의 섭리"며 "인간 윤리"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다.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고개가 끄덕여졌다.
허씨가 갑자기 입을 다문 것도 이런 여론의 질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몇 달 전만 해도 언론 등을 통해 딸 얘기며 심경을 당당하게 밝혔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을 TV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싱글맘(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대변자가 되려 작정한 듯했다.
하지만 이번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나는 싱글맘의 기수(旗手)가 아니다"고 했고, "많이 시달렸다"고도 했다. 그로선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곤 생각 못한 듯하다. '변형(變形) 가족'에 대한 주류 여론의 벽은 아직 높다.
삶이 팍팍해질수록 전통적인 가족 원형(原型)이 그리워지기 마련이다. 여러모로 힘든 지금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것은 작가 신경숙의 '엄마'일 것이다. 그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고향의 어머니를 그렸다. 묵묵히 다 감싸주는 바다 같은 어머니…. 책을 읽으며 나도 눈시울을 붉혔다.
다만 세상엔 신경숙의 엄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기'의 국민 어머니 김혜자도 변신했다. '엄마가 뿔났다'에서 가출까지 하며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 도시형 어머니로 바뀌더니, 영화 '마더'에선 지독한 광기(狂氣)의 모성애를 보여주었다.
얼마 전 개봉했던 '마더'의 김혜자는 논란거리가 많은 어머니상(像)이다. 정신지체 아들을 버리려 했다든지, 아들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로테스크한 대목은 전통적 가족 관념으론 소화하기 거북하다. 하지만 거북하다 해서, 우리가 김혜자의 '마더'를 부정하거나 비난할 수 있을까.
세상엔 다양한 가족이 있다. 세번 이혼한 뒤 다른 성(姓)의 자녀들과 살아가는 작가 공지영의 가족('즐거운 나의 집')도 있고, '남편은 싫고 아이만 원한다'는 한고은의 가족(SBS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도 있다. 싱글맘으로 살다 간 고(故) 최진실에겐 전 남편의 성을 지우면서까지 품고 싶었던 두 자녀가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의 해체와 붕괴를 걱정한다. 그러나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아니라 해서 '가족해체'로 규정한다면 핀트가 어긋났다. 한 부모 가족(엄마 혹은 아빠+자녀)이며 비혼모(결혼 대신 아이만 선택한 엄마), 재혼가정 역시 소중히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가족이다. 가족은 시대에 적응하며 재탄생할 뿐 붕괴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가족을 갖고 있다. '마더'의 김혜자에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하고 싶은 아들이 있듯이, 허수경에겐 어떻게든 얻고 싶던 딸이 있다. 김혜자의 모성애가 눈물겹다면, 허수경의 모성애도 소중하다.
허씨의 두 살배기 딸이 보란듯이 잘 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하게 자라 세상의 걱정이 틀렸음을 증명해주었으면 좋겠다.
- 박정훈·사회정책부장
'2. Humanities > 23_생각해볼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한민국 사교육 왜 강한가? (0) | 2009.08.04 |
|---|---|
| 스타를 지켜주지 못하는 풍토 (0) | 2009.08.04 |
| [스크랩] 마음을 적시는 아름다운글 (0) | 2009.07.30 |
| 애정결핍 노인들, 뛰쳐나가라 (0) | 2009.07.24 |
| 뒤바뀐 아기 (0) | 200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