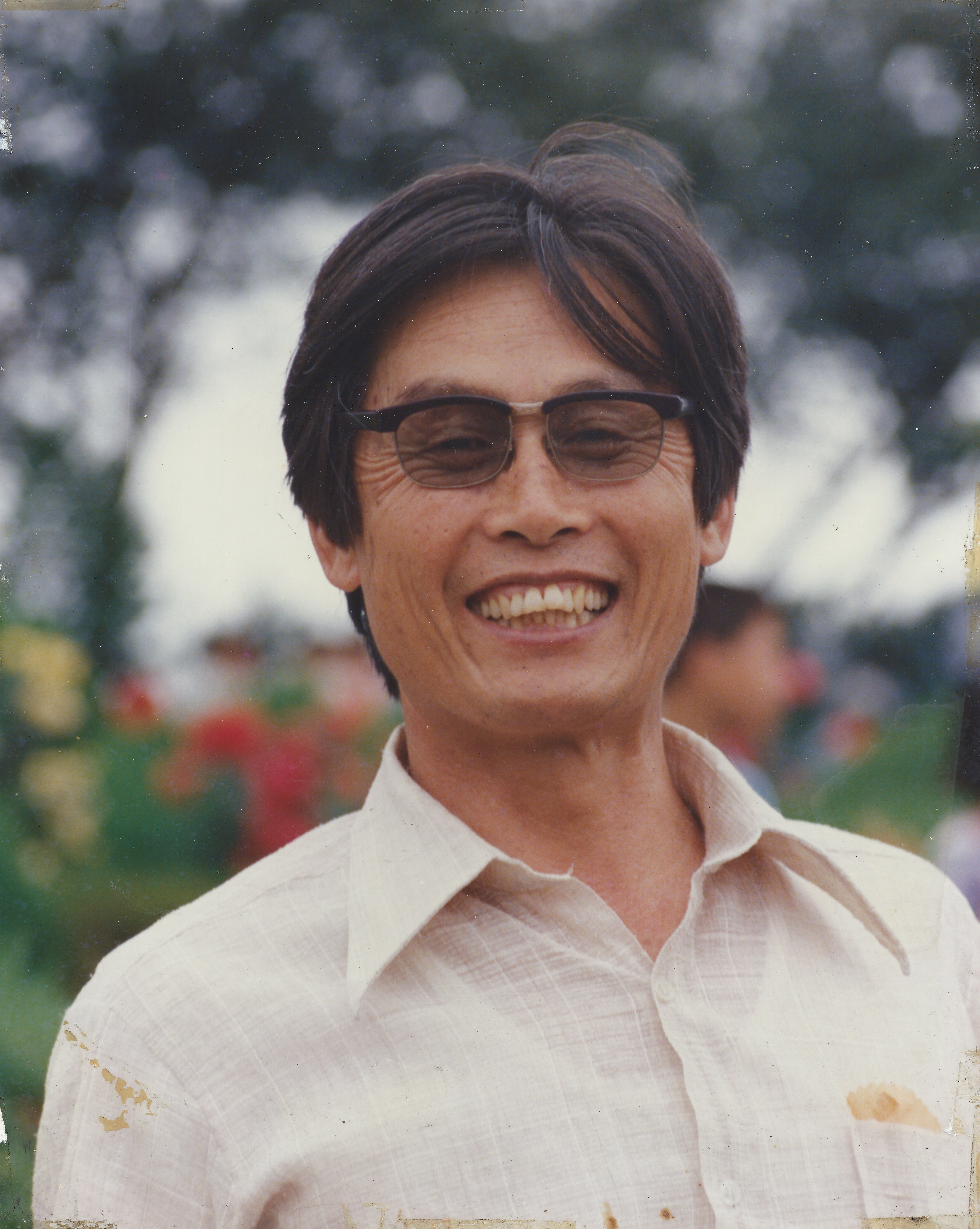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특파원 칼럼] 유럽식 휴가 못 가는 이유

- ▲ 김홍수 파리 특파원
요즘 한국의 쌀에 해당하는 바게트(프랑스인의 주식인 길쭉한 빵)를 구하기가 어렵다. 동네 빵집들이 모조리 '여름 휴무'에 들어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빵집의 휴가기간은 대개 한달. 우리 아파트 관리인 아주머니도 포르투갈 고향마을로 한달짜리 휴가를 가버려 신문과 우편물 배달이 잘 안 되고 있다. 몇달째 실직자로 놀고 있는 옆집 노처녀도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여름휴가를 떠났다. 밤에 보니 눈에 들어오는 20가구 중 불 켜진 집은 3가구밖에 안 된다.
요즘 파리 시내에 나가보면 거리는 관광객들만 넘쳐나고 파리지앵들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덕분에 시내 도로가 뻥뻥 뚫리고, 길거리에 주차하기도 아주 쉬워졌다. 특파원으로 부임해 처음 이런 현상을 접했을 땐 기가 막혔다. '주 35시간만 일하고 만날 노는 사람들이 또 한달씩 쉬다니….' 부럽단 생각이 들다가도 한국과 비교하면 부아가 치밀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스스로를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 선진국'으로 자임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각국이 재정악화 문제로 복지제도를 손보기 시작했지만,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생활 방식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런 삶의 질의 차이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경제 지표에서 힌트를 찾자면 선진국의 노동생산성이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훨씬 높다. 같은 일을 해도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르니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놀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 우선 흔히 기술과 지식의 차이를 들지만, 외국 나와 살아보면 이런 논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은행 출납 창구, 구청 민원 창구, 수퍼마켓 계산대 등 생활에서 접하는 선진국 노동력의 품질은 한국인의 잰 손놀림에 비하면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답은 자본력의 격차에 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맨손'으로 하는 것과 특화된 '장비'를 갖추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사례를 통해 보자.
한번은 동네 빵집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온 트럭을 본 적이 있다. 한국처럼 밀가루 포대를 인부들이 등져 나르는 게 아니라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꽂듯 밀가루 저장고로 통하는 파이프에 호스를 꽂고 밀가루를 불어 넣었다. 인부 2~3명이 달라붙어 한나절 해야 소화할 작업량을 단 10분 만에 끝내고 돌아가는 모습이었다. 파리 시내엔 개똥만 치우는 청소부가 따로 있다. 개똥 청소부들은 진공청소기 모양의 특수장비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타고, 반경 2~3㎞ 내 개똥 청소를 혼자서 거뜬히 해낸다. 하루는 한국 예술가의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던 샹젤리제 인근의 한 상업화랑에 갔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겉보기엔 작고 초라한 화랑이었는데, 야수파의 거두 루오(Rouault)의 작품을 140여점이나 갖고 있었다. 전 세계 미술관이 이 화랑의 협조 없이는 루오 전시회를 기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랑이 뒤따랐다. 이것도 적게 투입해서 많이 얻는 생산성이 아닐까.
한국이 수출실적 면에서 영국을 따라잡고, GDP(국내총생산) 규모로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 선진국을 추월했다지만,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총자본 면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유럽인들이 한달씩 휴가를 즐겨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ETIC > 41_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erpetual twilight of red dwarf planet Gliese 581g may host 'band of l (0) | 2010.09.30 |
|---|---|
| 한국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저하에 대하여kosby2008.11.26 1 (0) | 2010.09.06 |
| ‘한국인 자스민’ 코리안 드림만은 잃지 않길 … [중앙일보] (0) | 2010.08.10 |
| '벌금' 38억 족쇄…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요"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 (0) | 2010.07.26 |
| 해외서 주목 끈 말기암 정복 도전 한의사 (0) | 2010.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