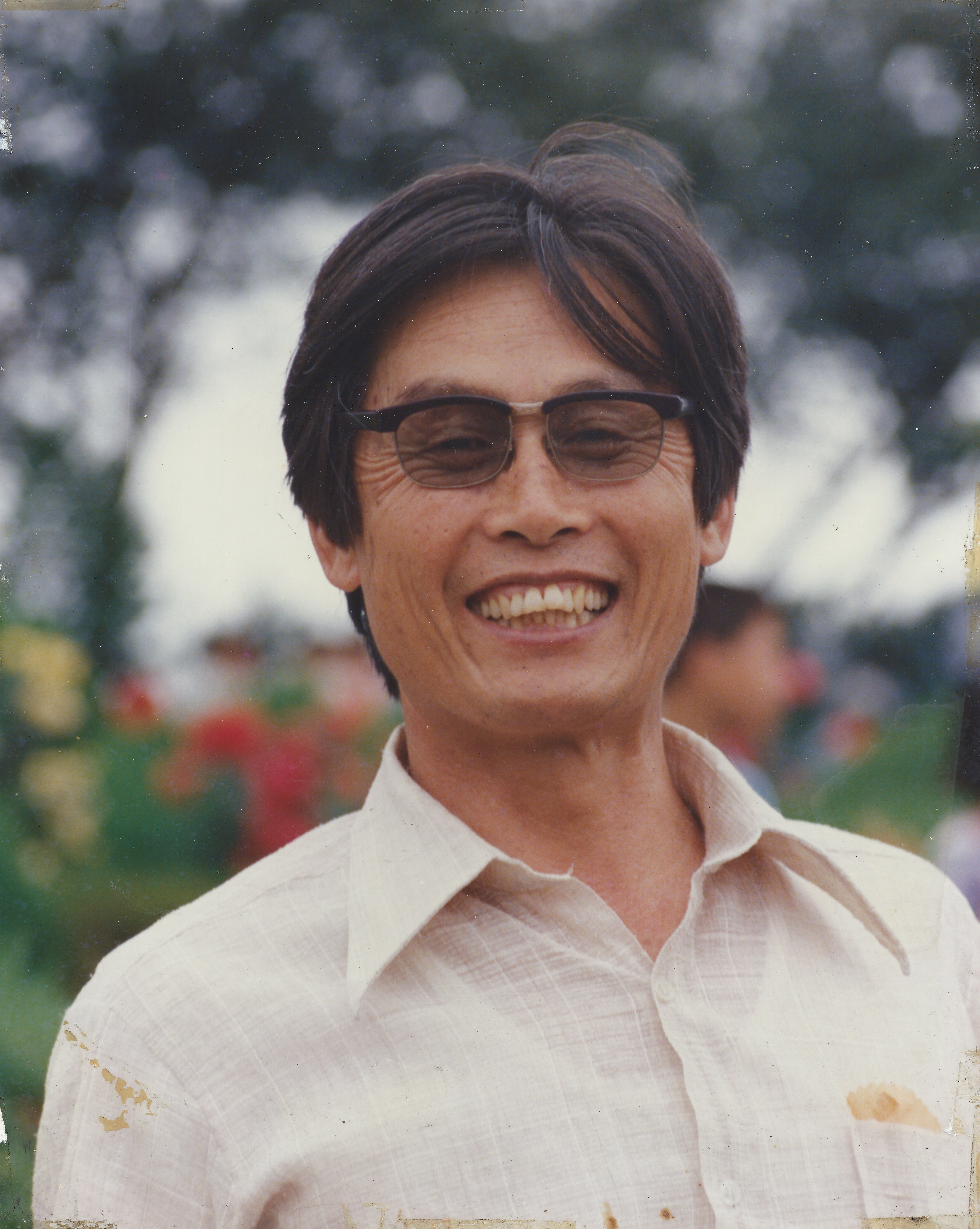봄은 왔는데 벌은 어디에… ‘토종벌 구제역’ 비상
토종벌이 사라진 원인과 영향은
2011년 04월 15일
“작년에 벌통 500개를 태웠습니다. 올해는 10통 구입했는데 또 죽고 있어요.”
전북 남원에서 토종벌을 기르는 김남규 씨(46) 는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해 전국 토종벌의 76.7%, 총 77억 마리의 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토종벌의 구제역인 ‘낭충봉아부패병(SBV·Sacbrood Virus)’이 다시 나타나 양봉 농가를 괴롭히고 있다.
봄이 오고 꽃은 피었지만 날아다니는 벌을 찾아보기 힘들다. 김 씨 말대로 전염병으로 벌들의 수가 준 데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봄철 이상한파 등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해외에서도 벌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의 실종’은 결국 식량위기로 이어져 인류에게도 재앙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활동범위 넓어 전염막기 어려워”
SBV는 남원뿐 아니라 인근 전남 구례와 곡성에서도 보고됐다. 토종벌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5월이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정부 지침대로 약을 주고 소독하고 벌통을 소각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SBV에 감염된 벌의 애벌레는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결국 일벌의 수도 줄어 두 달 안에 빈 벌통만 남게 된다. 벌 개체 수가 줄면 벌이 옮기는 꽃가루로 수분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사과나 복숭아의 생산량도 줄어든다.
이 전염병은 양봉도구나 외래 벌을 수입하면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SBV는 극동아시아형으로 1970, 80년대 중국과 인도 태국 등에서 유행했다”며 “교역을 통해 전염병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SBV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를뿐더러 확산을 막기도 어렵다. 벌은 반경 2∼3km를 날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정 교수는 “벌은 활동범위가 넓고 수입한 벌과 양봉도구도 전국에서 사용해 전염을 막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말 SBV 제거법을 개발했다. 현방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관은 “전북 완주군, 강원 홍천군 등의 농가에서 겔 형태의 이산화염소에 자외선을 쪼여 기체로 만든 뒤 벌통에 뿌렸더니 봄에 벌이 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험제품이어서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꽃 많이 못 피면 체력 약화
지난해 4월에는 눈이 올 정도로 추웠고, 5월에도 찬바람이 불었다. 이처럼 봄에 한파가 오면 꽃이 많이 피지 못한다. 꽃가루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벌들은 식량부족으로 체력이 나빠지고 바이러스에 취약해진다. 현 수의연구관은 “냉해로 벌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돌면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서양벌은 벌통에 놓인 먹이를 먹고 체력을 유지하지만 토종벌은 이와는 달리 사람의 손이 닿거나 벌통 위치가 바뀌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 개체 수 감소는 인류 식량 위협
벌 개체 수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06년부터 벌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봉군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약 34%의 벌집이 사라졌으며 중국과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기후 온난화 등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벌의 개체 수 감소는 인류의 식량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벌은 전 세계 식량의 90%에 해당하는 100종의 농작물 중 70여 종의 수분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식 전남도 농업기술원 과수담당은 “벌 대신 사람이 하는 인공 수분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벌의 개체 수가 줄지 않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1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벌의 개체 수 감소로 전 세계 식량작물의 수확이 줄어 인류 식량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호섭 동아사이언스 기자 wonc@donga.com
::낭충봉아부패병::
벌의 애벌레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된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는다. 주로 봄에서 여름 사이에 발병한다.전염 경로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2. Humanities > 23_생각해볼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데스크] 늘어나는 노인 분노범죄김민철 사회정책부 차장 mckim@chosun.com (0) | 2011.05.24 |
|---|---|
| [태평로] 나라를 멍들게 하는 공무원들의 '잔머리' (0) | 2011.05.20 |
| 고베의 교훈은 어디로 가고 (0) | 2011.03.19 |
| [태평로] '왜 중국인 엄마들은 우월한가'를 보고/이철민 디지털뉴스부장 (0) | 2011.01.30 |
| [스크랩] 정도전 재평가에 대한 소중한 자료 (0) | 2010.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