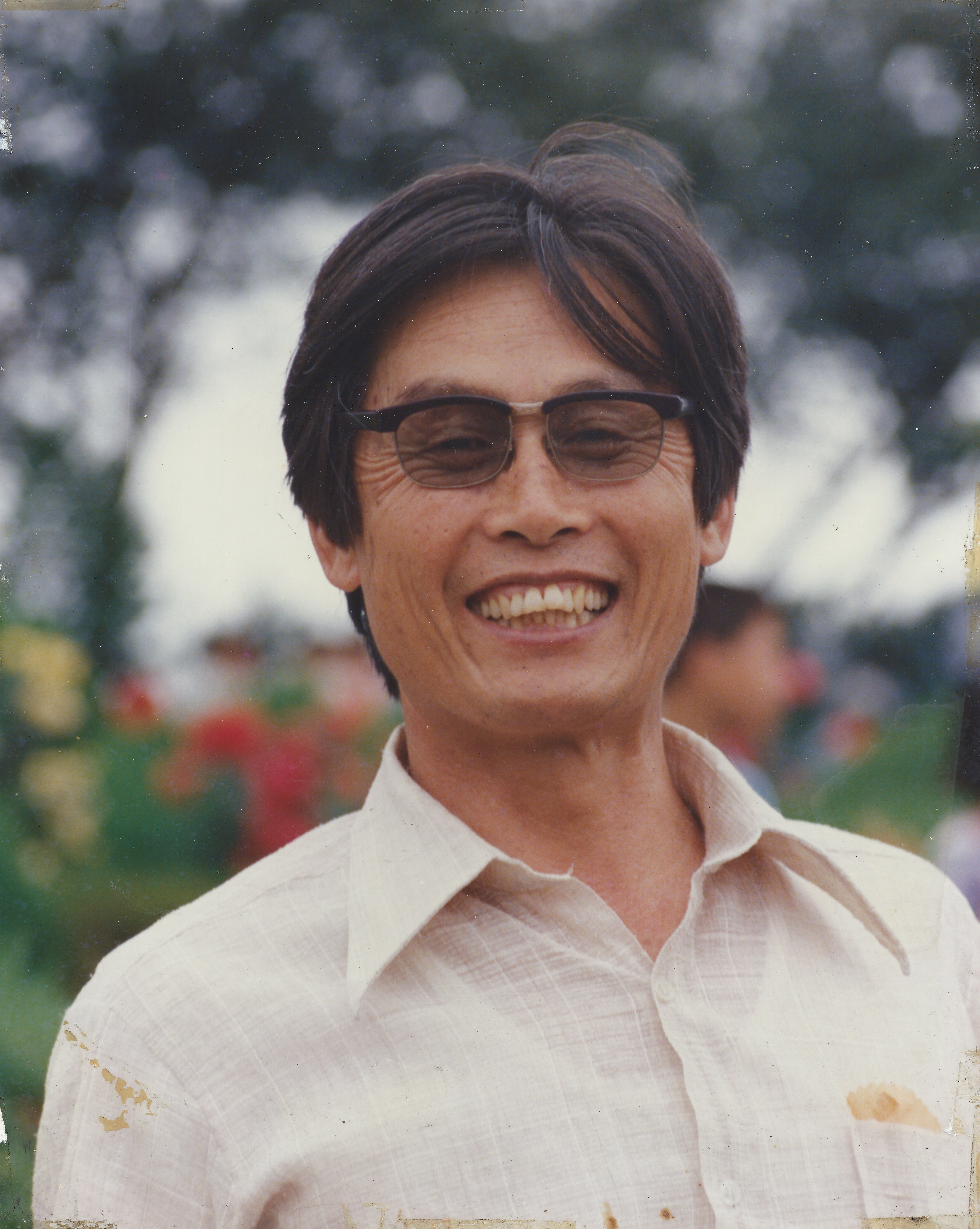2007년 5월 17일 (목) 14:33 노컷뉴스
80년 5·18 사진 속 '태극기 청년' 찾았다
‘1980년 5월20일은 5·18 민중항쟁 과정에서 ‘민주 기사의 날’로 기억된다. 이날 계엄군은 버스와 택시를 세워놓고 젊은이들을 무작정 끌고 가는 과정에서 기사들까지 무자비하게 구타·연행했다.
오후 6시 분노한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모여 대형버스 10여 대와 택시 200여 대를 앞세우고 금남로로 몰려나왔다. 이들의 경적과 헤드라이트 불빛은 금남로와 충장로에 결집한 시위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가공할 무력으로 인한 패배감이 강한 연대의식과 자신감으로 전환되어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를 해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광주오월민중항쟁연구사료전집,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편 발췌>
오후 6시 40분 시위대의 선두인 대형버스 지붕에는 20대 청년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청년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홀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 대열을 이끌었다.
이 모습은 광주일보(당시 전남일보) 사진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후 온 시민이 힘을 합해 ‘해방 광주’를 이끈 대표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로 각인됐다.
하지만,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은 이후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를 찾아 당시 상황을 다시 들어보려는 숱한 노력이 있었지만, 민중항쟁이 ‘폭동’으로 매도당하던 군사정권 하에서 ‘혹여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돼 스스로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청년은 초로의 나이가 됐고, 그날의 목숨 건 항쟁을 술자리에서까지 숨길 순 없었다. 얘기는 흘러 광주일보에 전해졌다.
광주일보는 27년 만인 16일 오후 ‘태극기 청년’ 박대현(55)씨를 찾아냈다. 그는 한국도로공사 장성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28살로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찾던 그는 전날 오후 대인동 버스터미널에서 공수부대에 맞은 뒤 울분을 찾지 못하고 이날 오후 금남로에 나왔다.
그는 수창초등학교 앞에서 도청으로 향하던 차량 시위대를 만나 맨 앞쪽 버스에 올라탔다.
잠시 후 누군가 “버스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자”고 소리쳤다.
박씨는 버스 안에 있던 태극기를 들고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올라갔다.
시민들의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박씨는 태극기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다.
저 멀리 도청에서 계엄군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가자 도청으로” “시민들을 때리지 말라” 여기저기서 구호가 터져나왔다.
도청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이 하나 둘 버스 위로 올라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마침내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해산돼 사직공원 쪽으로 물러갔다.
그래도 스스로의 힘을 확인한 시민들은 이날 밤 MBC방송국, 노동청, 세무서에 불을 지르고 도청과 광주역 주변에서 계엄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박씨는 “그날의 장면을 1990년께 TV 화면을 통해 처음 봤고, ‘누가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TV를 꺼버리고 말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항쟁이 끝난 뒤 많은 시민들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차마 주변에 자신의 버스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5·18 부상자로 인정받은 1990년 이후에도 입을 닫았다.
4명의 자녀 중 3명이 공무원이라 혹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
“대인동 터미널에서 군인들에게 맞으면서 한 벌 뿐인 외출복이 찢어져 그날은 양복을 입고 나갔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화면에 찍혔더라고요. 태극기를 흔든 게 큰 일도 아닌 데 자랑하고 싶은 맘도 없었습니다. ”
그는 요즘 순수했던 5·18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광주일보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1. Dr. Sam Lee > 15_80년5월18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80년 광주와 2007년 사라지는 사진들 (0) | 2007.05.18 |
|---|---|
| 5.18묘지 6년 뒤 만장…2묘역 본격 논의 (0) | 2007.05.18 |
| 27년째 ‘80년5월’…주인잃은 ‘시간’들 (0) | 2007.05.18 |
| 강풀, 5.18 광주를 얘기하는 만화 < 26년 > 출간 (0) | 2007.05.17 |
| 장학지도? (0) | 2007.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