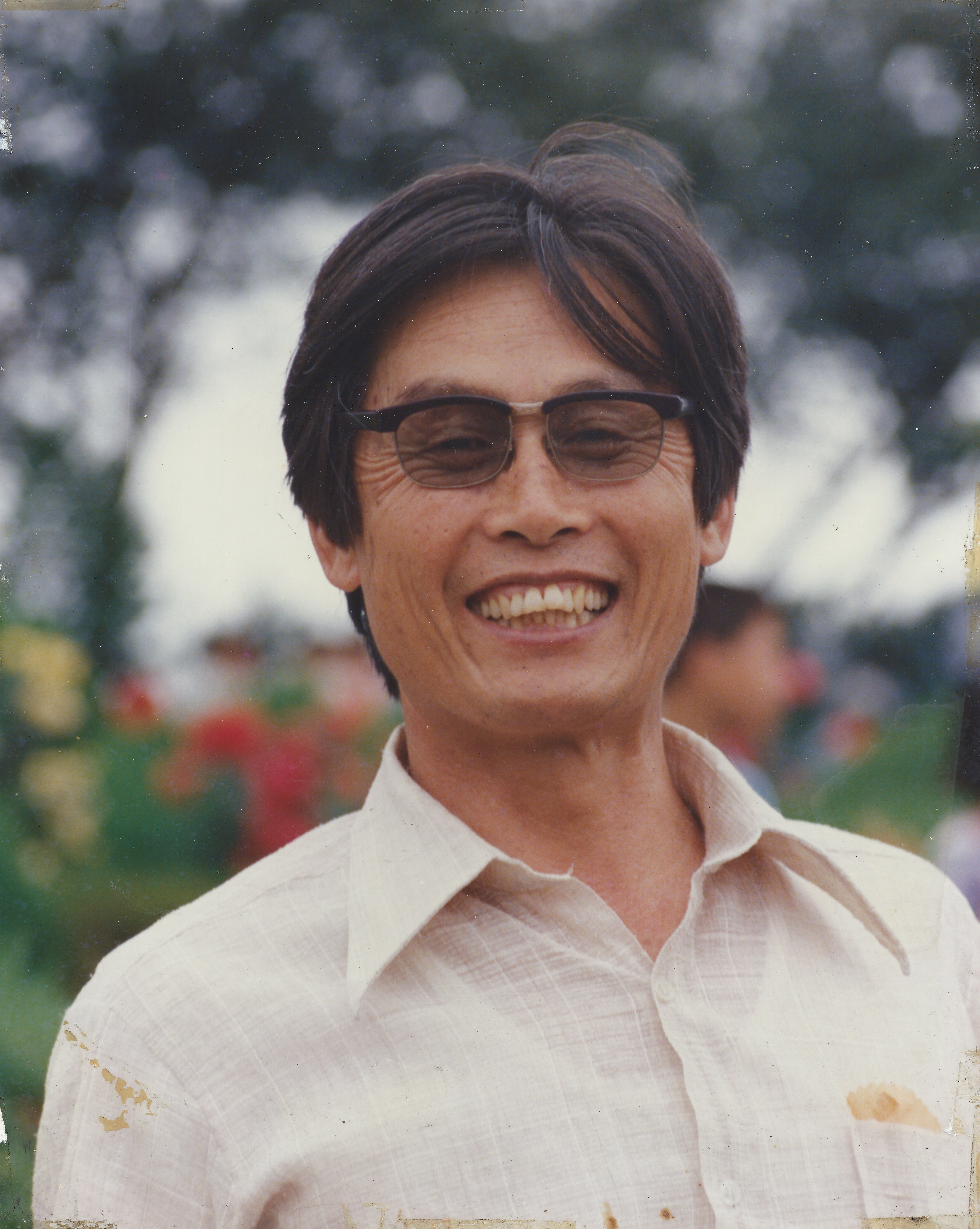반응형
| <푸른광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으등그러져 있더니 기어이 비가 뿌렸다. 주말이어서인지 K시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는 빈 좌석이 없었다. 의자를 한껏 뒤로 젖히고 비에 젖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알게 모르게 내 마음도 젖어들었다.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것다’는 시 한 구절 떠오르는 것도 그때였고, 유리 주렴 같은 빗방울에 요 며칠 그악스럽던 황사가 씻겨나가겠거니 생각이 든 것도 그 참이었다.
아마도 그때 내 마음은 황사에 덮인 세상 풍경들처럼 답답했을 것이다. 아픈 동생과 그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노모의 힘든 모습이 마음속에 체물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의 병은 쉽게 낫는 게 아니었고, 노모의 시름도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터였다. 주부가 아프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울해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 며칠 동안 동생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나선 길이라 마음이 더 무겁기만 했다.
그래도 동생은 가족이 있어 얼마나 다행한가. 식구들의 진심어린 위무도 받고, 변변치 않지만 일손을 보태주는 언니도 있고, 약 수발을 들어주는 어머니도 있으니…. 물질의 광휘 앞에서 나날이 가족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시대에 동생은 그나마 위태롭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노모 역시 그렇게라도 당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있었다.
한데 자꾸만 내 생각은 낮게 이어지는 뒷좌석의 대화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음성의 결이 하나는 나이가 들었고, 하나는 젊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슬쩍 뒤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전형적인 촌부였고, 며느리는 깍쟁이 서울 여자였다. 대화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그들은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는 듯했다. 며느리는 꼬박꼬박 어머님, 어머님 하고 경어를 쓰고 있었지만 왜 그 어머님이라는 음절이 야무지게 해대는 칼질처럼 느껴졌을까.
그랬다. 남도 땅 어느 끝자락, 쨍쨍한 햇살 아래 하나의 점으로 쭈그리고 앉아 파나 마늘, 참깨와 푸성귀 따위를 심고 가꾸던 그 늙은 촌부는 그렇게 알뜰히 맺힌 소출을 모아두었다가 서울 사는 아들 내외에게 부쳐주는 일로 삶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아들이 먹을 것을 재배하는 그 손길에, 마음에, 삿된 것이 끼어들 수는 없으리라. 한데 며느리는 한사코 그 촌부가 보내는 것을 사양하고 있었다. 이유는 어머니가 고생해서라는 것이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셔야 저희도 편하다며, 이제 힘든 노동일랑은 하지 말고 그저 남은 생을 뒷짐 지고 천천히 마당을 오가는 일로 소일하다 가시라고 했다.
며느리의 음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절마다에 힘이 실리면 실릴수록 시어머니의 음성은 점점 힘이 없어졌다. 하긴 시장에 가면 때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을거리들이 널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찌그러지고 알이 작은 것들이 고마울 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정이고, 가족이라는 유대감이었다는 사실을. 가족이 뭘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삶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먼 타인이 돼 버렸다. 부러 무심해지는 일이, 정도 계량해서 주거나 곤란한 청탁의 경우 야멸차게 거절하는 일이 앞으로의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지혜가 돼버렸다.
내 생각은 슬그머니 동생의 집에서 보냈던 며칠 간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아픈 동생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그녀를 보살펴줌으로써 생기는 고단함과, 내 시간이 분절되는 것에 대해 나는 무척이나 짜증스러워하고 있었다. 뒷좌석의 늙은 촌부가 뙤약볕 아래 사랑을 심고 가꾸는 그 시간들을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금만 내가 더 손을 내민다면, 내 생에 할당된 시간을 가족이라는 타인에게 나누어준다면 내 주변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각성이 답답하던 마음을 조금은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가족의 이름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넣었다. 하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 서둘러서 병 나을 생각을 하라고. 가장 힘들 때 가족을 찾으라고. 생에 가장 큰 힘은 가족이다.
[[은미희 / 소설가]]
기사 게재 일자 2007-04-05
아마도 그때 내 마음은 황사에 덮인 세상 풍경들처럼 답답했을 것이다. 아픈 동생과 그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노모의 힘든 모습이 마음속에 체물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생의 병은 쉽게 낫는 게 아니었고, 노모의 시름도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깊어질 터였다. 주부가 아프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우울해지고 희망이 사라져 버린다. 며칠 동안 동생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나선 길이라 마음이 더 무겁기만 했다.
그래도 동생은 가족이 있어 얼마나 다행한가. 식구들의 진심어린 위무도 받고, 변변치 않지만 일손을 보태주는 언니도 있고, 약 수발을 들어주는 어머니도 있으니…. 물질의 광휘 앞에서 나날이 가족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시대에 동생은 그나마 위태롭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노모 역시 그렇게라도 당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있었다.
한데 자꾸만 내 생각은 낮게 이어지는 뒷좌석의 대화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음성의 결이 하나는 나이가 들었고, 하나는 젊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슬쩍 뒤돌아보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전형적인 촌부였고, 며느리는 깍쟁이 서울 여자였다. 대화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그들은 누군가의 병문안을 가는 듯했다. 며느리는 꼬박꼬박 어머님, 어머님 하고 경어를 쓰고 있었지만 왜 그 어머님이라는 음절이 야무지게 해대는 칼질처럼 느껴졌을까.
그랬다. 남도 땅 어느 끝자락, 쨍쨍한 햇살 아래 하나의 점으로 쭈그리고 앉아 파나 마늘, 참깨와 푸성귀 따위를 심고 가꾸던 그 늙은 촌부는 그렇게 알뜰히 맺힌 소출을 모아두었다가 서울 사는 아들 내외에게 부쳐주는 일로 삶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아들이 먹을 것을 재배하는 그 손길에, 마음에, 삿된 것이 끼어들 수는 없으리라. 한데 며느리는 한사코 그 촌부가 보내는 것을 사양하고 있었다. 이유는 어머니가 고생해서라는 것이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셔야 저희도 편하다며, 이제 힘든 노동일랑은 하지 말고 그저 남은 생을 뒷짐 지고 천천히 마당을 오가는 일로 소일하다 가시라고 했다.
며느리의 음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음절마다에 힘이 실리면 실릴수록 시어머니의 음성은 점점 힘이 없어졌다. 하긴 시장에 가면 때깔 좋고, 먹음직스러운 먹을거리들이 널렸는데, 굳이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찌그러지고 알이 작은 것들이 고마울 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고, 정이고, 가족이라는 유대감이었다는 사실을. 가족이 뭘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각자의 삶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먼 타인이 돼 버렸다. 부러 무심해지는 일이, 정도 계량해서 주거나 곤란한 청탁의 경우 야멸차게 거절하는 일이 앞으로의 나은 관계를 위해 필요한 지혜가 돼버렸다.
내 생각은 슬그머니 동생의 집에서 보냈던 며칠 간의 시간으로 이동했다. 아픈 동생이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그녀를 보살펴줌으로써 생기는 고단함과, 내 시간이 분절되는 것에 대해 나는 무척이나 짜증스러워하고 있었다. 뒷좌석의 늙은 촌부가 뙤약볕 아래 사랑을 심고 가꾸는 그 시간들을 나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조금만 내가 더 손을 내민다면, 내 생에 할당된 시간을 가족이라는 타인에게 나누어준다면 내 주변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각성이 답답하던 마음을 조금은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가족의 이름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넣었다. 하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 서둘러서 병 나을 생각을 하라고. 가장 힘들 때 가족을 찾으라고. 생에 가장 큰 힘은 가족이다.
[[은미희 / 소설가]]
기사 게재 일자 2007-04-05
반응형
'0. 韓山李氏 > 11_小說家殷美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른광장> 러시안 룰렛게임/문화일보 (0) | 2008.03.28 |
|---|---|
| 나를 비우는 삶/문화일보 (0) | 2008.03.28 |
| 살아 있음의 아름다움/문화일보 (0) | 2008.03.28 |
| 새벽을 여는 두부장수/문화일보 (0) | 2008.03.28 |
| <신춘문예>단편소설 당선작 ‘다시 나는 새’/문화일보 1999 (0) | 200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