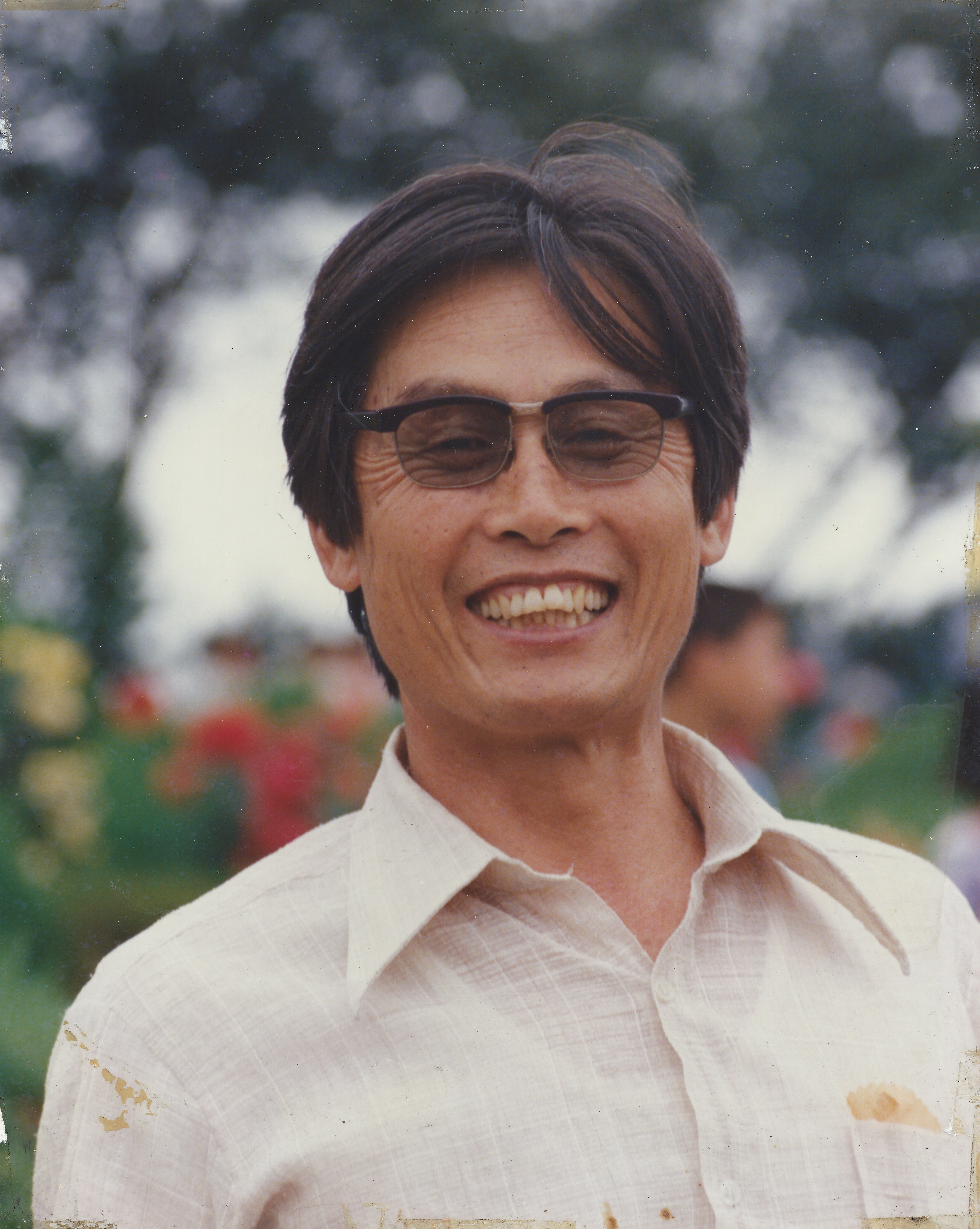5월 영령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묘지’는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역사의 현장이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는 광주민중항쟁 2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참배객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참배 열기는 연중 내내 계속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신랑·신부, 손자의 고사리손을 이끌고 오는 노부부, 대학생 단체 참배객, 중·고교 수학여행단, 외국 유명인사, 내로라하는 정치인도 이곳에서 고개를 숙인다. 줄잡아 연인원 1백만명. 5·18묘지는 어느덧 ‘민주화 성지’로 자리매김했다.
5·18묘지가 오늘날처럼 자리하기에는 가해자들의 온갖 핍박과 이에 동조하는 ‘반 5·18세력’의 싸늘한 시선을 억척스럽게 넘고 일궈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립 5·18묘지’의 뿌리는 현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1㎞ 떨어진 광주시립공원 한쪽의 제3묘역이다.
1980년 5월29일 새벽. 이틀전 도청으로 진격해 ‘무자비한 살상’을 통해 시민군을 제압한 계엄군이 이름도 모르는 희생자 11구를 포함, 모두 126구의 시신을 청소차에 싣고 와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
‘폭도들’ ‘반란자’라는 오명 속에 쓸쓸하게 ‘억지 장례’가 치러진 것이다. 이후 이들은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이한열·조성만·이철규·강경대 등 민주열사 31구와 함께 이곳 ‘망월동 묘지’에 쓸쓸히 묻혀 있다가 97년 현
국립묘지로 이장됐다.
국립 5·18묘지는 여전히 ‘망월동 묘지’로 더 많이 불린다. 80년대초 정보과 형사들의 밀착감시로 묘지 참배조차 못하고 되돌아오면서 눈물을 떨구던 곳이 바로 망월동이다. ‘달을 바라본다’는 망월(望月)의 뜻이 밤마다 달을 보며 울분을 삭여야 했던 당시 광주시민 정서와 맞아떨어지면서 그대로 ‘망월동 묘지’로 굳어졌다.
87년 ‘6·29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금기지역’이었다. 묘역 주변을 배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됐고 매년 5월이면 유족들은 닭장차에 실려 강원도까지 강제로 ‘단체유람’을 떠나야 했다.
5·18묘역이 위령탑 등 장엄한 시설물 등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93년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5·18묘역 성역화 사업’ 결과다. 김영삼 정권은 950평짜리의 초라하기 그지없던 묘지를 새로운 터(5만평)에 국비 등 2백61억원을 들여 97년 5월 완공했다.
국립묘지로 승격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7월. 이곳엔 현재 옛 묘역에서 옮겨온 당시 희생자와 부상후 사망자 등 모두 423명의 영령이 잠들어 있다. 5·18 관련자 4,000여명도 ‘안장 자격’을 얻어놓고 있다.
‘5·18묘지’는 대권주자 등 유명 정치인의 ‘정치 선언장’이 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5·18 관련자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차례 찾았다. 그러나 ‘묘지 성역화’를 주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와 묘지 성역화 후 등 2차례 참배하려 했으나 남총련 학생들이 ‘5공 상속자’라는 이유로 길을 막아 좌절됐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첫해 ‘5·18기념식’에 참가하던 중 대학생들이 ‘대미 굴욕외교’를 주장하며 진입로를 봉쇄,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모를 당했다.
5·18 가해자인 ‘5공 세력’ 가운데는 2002년 대선에 나섰던 장세동씨가 유일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들어가는 ‘뚝심’을 과시했고 지난해 9월엔 미국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크리스토퍼 힐 주한대사가 참배했다.
〈광주|배명재기자〉